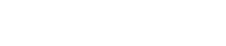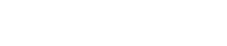향싼 종이에선 향내가 나고
페이지 정보
본문
향싼 종이에선 향내가 나고
사교과/송벽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본래는 깨끗했지만 차츰 물들어 친해지면서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가장 진한 물듦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스며들어 닮아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교반 송벽입니다.
선방에서 결제중이신지라 한 철동안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스님께서 한번 다녀갔으면 해서 찾아간 그곳엔 겉으론 시골 노스님처럼 보이지만,
호랑이 눈썹에 사자처럼 용맹한 청안으로 사부대중을 이끄시며 한평생 일로 수행을 삼고 계신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영화나 연극 캐스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배우 중 그 역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첫 눈에 알아본다고 합니다.
인연이었을까요?
분명 처음 가 본 곳, 처음 뵌 노스님인데 낯설지 않은 것을 보면...... 처음 뵌 노스님은 연세가 92세였는데도 오히려 50대 중년보다 더 활기있고 건강하셨습니다.
발음도 분명하시고요. 아마도 정진력 때문인가 봅니다.
인사를 드리자 “온 곳이 어딘줄 아나” 이북 특유의 발음으로 물으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스님이 살고 있는 곳을 말씀드리라 하셨지만 전 그냥 빙그레 웃고 말았습니다.
노스님이 말씀하신 집은 그것이 아니었으니까요.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인사드리러 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스님께선 내일이라도 당장 짐싸서 오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기 전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크게 웃으시며 노스님과 저의 전생이 이곳임을 알려주시며 빨리 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며칠 후 다시 간 그곳은 고향 자체였습니다.
인사를 드린 다음 당돌하게도 “노스님 앞으로 얼마가 될 진 모르지만 아침 저녁엔 기도하고 나머지는 노스님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노스님은 손뼉까지 치며 “좋다, 좋아 그래라” 하시며 함빡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천진무구한 5세 동자 같으신지......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법당에 갈 때면, 도량을 둘러보신 노스님께선 방에 들어가 좌선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마칠 때까지 흐트러짐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불편할까 봐 법당에 가지 않고 배려해주시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늘 일찍 일어나 그 모습을 보며 발심하고 있는 저를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도량석이 올라갈 때 까지 노스님의 모습을 흉내내어 좌선을 했습니다.
5시면 기도가 끝나는데 그 때부터 저의 또 다른 일상이 시작됩니다.
우리 몸속에 담긴 정신적 번뇌마저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 근심마저 푸는 곳, 해우소.
“버리고 또 버리니 큰 기쁨일새. 탐ㆍ진ㆍ치 어둔 마음 이와 같이 버려 한조각 구름마저 없어졌을 때 서쪽의 둥근 달빛 미소지으리”
물이 안나와서 양동이를 들고 30 여개의 계단을 여러번 오르내려야 하지만, 입측오주처럼 맑아진 정랑을 보면 청정도량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6시 공양 후 2시간에 걸쳐 깨끗이 비질을 합니다.
비질된 도량이 마치 물결치는 파도에 한 마리 학이 살며시 앉아 추는 춤사위처럼 장엄해보인다며 스님들은 저를 주리반특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몇십년 된 고목 여러 개가 죽어서 베어낸 적이 있습니다.
정랑부터 30여개의 계단을 지나 마당으로 옮겨와서 장작을 패야 하는데 일을 아는 이들은 슬그머니 빠지고 멋모르는 저와 곰같은 처사님 둘이 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보조 한명 구해서 두 팔로 안아야 간신히 지게에 실을 수 있는 나무토막을 지고 한번 두 번.... 그렇게 20번이 넘으니 다 옮겨졌습니다.
산처럼 쌓인 나무를 옮겨 장작을 패는데 어느 새 몰려든 스님들이 저와 상좌스님을 비교하며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매, 주리반특가는 못하는 것이 없어유. 틀림없이 전생에 이 절 중이 맞는 가뷰. 근데 아따 스님은 뭐 한다요. 시방 성적이 저조하잖어유.”
“스님, 저도 잘 해요. 시방, 이 도끼가 말을 안들어 그래요.” “아따, 일 못하는 사람이 꼭 연장 탓 한다더니 시방 스님이 꼭 그 꼴이잖어유.” 묵묵히 장작을 패면서
저는 저의 인내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결재를 얼마 앞둔 어느날 상좌스님은 제게 노스님 시자를 부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더욱이 스님도 아닌 제가 감히 나설 자리는 아니지만, 만장일치로 떠미는 통에 승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간에 숨은 도인으로 알려진 노스님이기에 조심스러우면서 부담도 컸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큰 스님들은 복이 많다면서 가까이 모실 때 열심히 배우고 익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원효스님은 이 절터를 보고 도인이 나올 거라며 기뻐 3일 동안 춤을 추셨답니다.
무소유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데도
무소유라는 이름으로 참고 사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도인도 달리 도인이 아니라, 알지만 말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힘,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둘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도인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도는 아직 설익은 도일 뿐입니다.
스님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큰스님은 법문을 잘 하시거나 모습이 멋있으시거나 큰 사찰의 주지를 하시거나 미래를 잘 알아맞히며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행(行)으로 젊은 스님들께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큰스님이라고 뒷짐지고 물러나 계시는게 아니라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고 하심합니다.
제가 1년 동안 보아 온 노스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중생은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일이 되길 소망하고, 부처님은 본인 앞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식으로 일이 되길 소망하기에
부처님은 날마다 좋은 날이지만 중생은 어쩌다 좋은 날입니다.”
흔히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은 신기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닐까요.
103 세의 연세로 노스님께서는 작년에 열반하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십분의 일이라도 노스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발원해봅니다.
*** 현재 운문승가대학에 재학 중인 송벽스님의 차례법문이었습니다.
사교과/송벽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본래는 깨끗했지만 차츰 물들어 친해지면서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가장 진한 물듦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스며들어 닮아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교반 송벽입니다.
선방에서 결제중이신지라 한 철동안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스님께서 한번 다녀갔으면 해서 찾아간 그곳엔 겉으론 시골 노스님처럼 보이지만,
호랑이 눈썹에 사자처럼 용맹한 청안으로 사부대중을 이끄시며 한평생 일로 수행을 삼고 계신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영화나 연극 캐스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배우 중 그 역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첫 눈에 알아본다고 합니다.
인연이었을까요?
분명 처음 가 본 곳, 처음 뵌 노스님인데 낯설지 않은 것을 보면...... 처음 뵌 노스님은 연세가 92세였는데도 오히려 50대 중년보다 더 활기있고 건강하셨습니다.
발음도 분명하시고요. 아마도 정진력 때문인가 봅니다.
인사를 드리자 “온 곳이 어딘줄 아나” 이북 특유의 발음으로 물으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스님이 살고 있는 곳을 말씀드리라 하셨지만 전 그냥 빙그레 웃고 말았습니다.
노스님이 말씀하신 집은 그것이 아니었으니까요.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인사드리러 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스님께선 내일이라도 당장 짐싸서 오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기 전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크게 웃으시며 노스님과 저의 전생이 이곳임을 알려주시며 빨리 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며칠 후 다시 간 그곳은 고향 자체였습니다.
인사를 드린 다음 당돌하게도 “노스님 앞으로 얼마가 될 진 모르지만 아침 저녁엔 기도하고 나머지는 노스님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노스님은 손뼉까지 치며 “좋다, 좋아 그래라” 하시며 함빡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천진무구한 5세 동자 같으신지......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법당에 갈 때면, 도량을 둘러보신 노스님께선 방에 들어가 좌선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마칠 때까지 흐트러짐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불편할까 봐 법당에 가지 않고 배려해주시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늘 일찍 일어나 그 모습을 보며 발심하고 있는 저를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도량석이 올라갈 때 까지 노스님의 모습을 흉내내어 좌선을 했습니다.
5시면 기도가 끝나는데 그 때부터 저의 또 다른 일상이 시작됩니다.
우리 몸속에 담긴 정신적 번뇌마저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 근심마저 푸는 곳, 해우소.
“버리고 또 버리니 큰 기쁨일새. 탐ㆍ진ㆍ치 어둔 마음 이와 같이 버려 한조각 구름마저 없어졌을 때 서쪽의 둥근 달빛 미소지으리”
물이 안나와서 양동이를 들고 30 여개의 계단을 여러번 오르내려야 하지만, 입측오주처럼 맑아진 정랑을 보면 청정도량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6시 공양 후 2시간에 걸쳐 깨끗이 비질을 합니다.
비질된 도량이 마치 물결치는 파도에 한 마리 학이 살며시 앉아 추는 춤사위처럼 장엄해보인다며 스님들은 저를 주리반특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몇십년 된 고목 여러 개가 죽어서 베어낸 적이 있습니다.
정랑부터 30여개의 계단을 지나 마당으로 옮겨와서 장작을 패야 하는데 일을 아는 이들은 슬그머니 빠지고 멋모르는 저와 곰같은 처사님 둘이 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보조 한명 구해서 두 팔로 안아야 간신히 지게에 실을 수 있는 나무토막을 지고 한번 두 번.... 그렇게 20번이 넘으니 다 옮겨졌습니다.
산처럼 쌓인 나무를 옮겨 장작을 패는데 어느 새 몰려든 스님들이 저와 상좌스님을 비교하며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매, 주리반특가는 못하는 것이 없어유. 틀림없이 전생에 이 절 중이 맞는 가뷰. 근데 아따 스님은 뭐 한다요. 시방 성적이 저조하잖어유.”
“스님, 저도 잘 해요. 시방, 이 도끼가 말을 안들어 그래요.” “아따, 일 못하는 사람이 꼭 연장 탓 한다더니 시방 스님이 꼭 그 꼴이잖어유.” 묵묵히 장작을 패면서
저는 저의 인내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결재를 얼마 앞둔 어느날 상좌스님은 제게 노스님 시자를 부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더욱이 스님도 아닌 제가 감히 나설 자리는 아니지만, 만장일치로 떠미는 통에 승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간에 숨은 도인으로 알려진 노스님이기에 조심스러우면서 부담도 컸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큰 스님들은 복이 많다면서 가까이 모실 때 열심히 배우고 익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원효스님은 이 절터를 보고 도인이 나올 거라며 기뻐 3일 동안 춤을 추셨답니다.
무소유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데도
무소유라는 이름으로 참고 사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도인도 달리 도인이 아니라, 알지만 말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힘,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둘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도인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도는 아직 설익은 도일 뿐입니다.
스님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큰스님은 법문을 잘 하시거나 모습이 멋있으시거나 큰 사찰의 주지를 하시거나 미래를 잘 알아맞히며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행(行)으로 젊은 스님들께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큰스님이라고 뒷짐지고 물러나 계시는게 아니라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고 하심합니다.
제가 1년 동안 보아 온 노스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중생은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일이 되길 소망하고, 부처님은 본인 앞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식으로 일이 되길 소망하기에
부처님은 날마다 좋은 날이지만 중생은 어쩌다 좋은 날입니다.”
흔히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은 신기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닐까요.
103 세의 연세로 노스님께서는 작년에 열반하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십분의 일이라도 노스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발원해봅니다.
*** 현재 운문승가대학에 재학 중인 송벽스님의 차례법문이었습니다.
- 이전글참회 (재우스님) 20.02.21
- 다음글일하며 놀며 배우며 20.02.21